誰かのもの語り
어김없이 추석증후군에 시달렸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고 이를 위해 그동안 아껴 놓았던 빅뱅이론의 에피소드들이 두편만을 남긴 체 다 소진되었다. 새벽에 들어온 지인에게 어제밤에 명절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징징거렸지만 무심한듯 시크하게 그는 웃고 말거나 침묵했고 -언제나 그렇듯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는 믿음-을 가장한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인간으로써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사실,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익숙한 이 공간에 내 일이 누군가에겐 의미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 이후부턴 그건 단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징징되기 위해 쓰는 것일뿐이지 누군가에게 위로받거나 공감받기 위해 쓰는게 아님을 고백한다. 어찌됐든 이 포스팅을 하려는 목적은 사실 제목을 쓰는 순간 정해졌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스스로의 글을 쓰고 싶지 않는 최근의 상황에도 블로그에 흔적을 남길 생각이 들었다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물론 이또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을 스스로 주체할수 없기에 썼다고 봐야 일편 타당할것이기는 하나 그런 사실의 일부요소까지 사실이라고 커밍아웃해버리면 이글에 대한 하나의 인상이 굳어지는 거 같아 그만두기로 하자.
어찌됐든 2,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잠에서 깨자마자 우연히는 아닌 습관적으로 들른 커뮤니티의글 목록중에 하나의 블로그로연결되었고 인간의 본능적인 남의 일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를 옹호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글은 명백히 누군가를 향해 겨냥된 그 사람 자신의 '심경고백'이기에 그런 글을 쓰는 용기는 칭찬해줄 만 하나 더불어 그 글의 파장을 글쓴이가 계산하에 넣었다라고 보았을때 그 또한 한 인간을 철저하게 매장시키기엔 충분해 보였고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함무라비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 여론이라는 이름의 전혀 관계없은 이들을 통해 비뚫어진 시각 혹은 "샤덴 프로이데" 적인 시각으로 볼것이 명약관화한 사건이기에 어딘가 모르게 드는 씁쓸한 기분이 들고 말았다. 물론 이는 머릿속 한켠에 Beyond the truth라는 상대주의적인 발상이 인터넷 저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경험들과 합쳐진 내 경험론적인 옹졸함이자 스테레오 타입의 일부라고 쳐두자. 어찌됐든 이 사건에서 누군가의 복수극에 대한 흥미는 내 관심사가 아니기에 제쳐 두더라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공적인 의미를 지녔을때 그 이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기분'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인지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들이 수면위로 올라온 사건이라는 의미가 나에게 더 크다라고 하겠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그 글로 공론화된다라면 그 글이 선한 의지가 있더라도 그 글의 파장은 다른쪽으로 겨냥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근래 회자되고있는 '여자아이 성폭행사건'에 대한 내 감정이기도 하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이를 공론화 시켰을때 그 이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이들을 본적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다. 이는 나에게 무척이나 화나는 사실이며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의를 말하는 이들이 대수롭지 않는 일이라고 사회통념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다. 한국의 성폭행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 문제이고 수많은 이들의 '정의감에 빠진' 감정들이 그 피해자들을 더욱더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모른다는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한 사회의 비극은 그 사회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그 돌연변이만 제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이 아닐 것이다. 위정자들은 그 돌연변이들을 자신들의 대중적 인기에 이용할 뿐 시스템에 매스를 들이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대중들은 조금더 강렬하고 지독한 복수극을 보길 원할뿐 그 속의 맥락과 시스템의 모순에 대한 세밀한 접근 따윈 관심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대중들은 그곳으로 관심이 옮겨갈뿐. 이런 추악한 현실이 반복되고 그 속의 피해자는 덩그라니 남겨져 있다.
거품빠진 풍선들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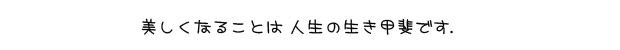
 rss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