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아무 생각없이 쓰는 스타리그 이야기입니다.
전 예전부터,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프로토스의 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때도 있고
지금은 여전히 한 선수-김택용-의 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스타리그 결승이 있었습니다.
프로토스 도재욱과 저그 박성준의 결승.
그리고 김택용 선수가 속한 SK T1이라는 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도재욱 선수를 응원했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박성준 선수가 3:2정도의 박빙의 승부로 이겨주길 바랬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도재욱 선수가 3:0으로 진 것에 대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토스 선수가 진 것에 대한 종족적 비애에서 오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재미난 경기를 해주길 바란 것 뿐.
언젠가부터일껍니다. 정확하겐 모르겠어요.
몇가지 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프로토스 선수의 경기를 모두 감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토스 선수를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주 5 프로리그가 되면서 수많은 프로토스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전 여전히 대부분의 스타리그 경기를 보긴 하지만 가끔씩 보기 싫을꺼같은 예상이 드는 경기들을
스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기들의 기준은 예전같으면 프로토스가 나오지 않은
경기들이었지만 현재의 기준은 화제가 되지 않을 경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속한 팀 경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팀 경기는 가려가면서 봅니다.
이것이 협회에서 의도한 팀리그 체제의 경기감상법일껍니다.
네 제 취향도 협회의 의도대로 변한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확실합니다.
전 자발적인 종족 혹은 선수의 팬에서 강제적인 한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팀이 잘하기에 기분은 좋습니다만 언제까지 응원하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둘째, 제가 싫어하는 테테전을 언젠가부터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테테전을 포함한 동족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팬으로써 테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리그 초창기부터 왠만한 경기를 다 볼때도 가끔 보지않았던 경기들은 테테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테테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응원하는 선수의 팀의 테테전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으론 유명하고 잘하는 테란들의 테테전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몰랐던 테테전의 재미를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골라보는 습관을 더더욱 길러주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프로리그 체제에서 가장 많은 것은 종족전이며 특히나 2008년의 프로리그 체제에서 테테전은 제 기억에서 다 열거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대부분의 경기들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볼때는 재밌었던 경기도 물론 있었지만 이것 역시 어떡해보면 스타리그에서의 "대안적 재미"를 찾으려는 매니아 팬의 발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겐 여전히 가장 기대되고 기억에 남을 경기들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의 개인전이며 타종족의 가장 잘하는
선수와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프로리그의 체제에서 이런 경기가 일어날 확률은 순전히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미'를 느낀 스타리그가 언젠가부터 '상대적'인 재미를 느끼는 유흥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주 5일 프로리그라는 시스템은 스타리그매니아들에게 '팀에 대한 팬덤'을 강화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팀에 대한 팬덤은 사실 다른 스포츠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야구나 축구같은 구기종목에서 팀에 대한 팬덤은 굉장히 파괴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스타는 구기종목이 아니며 1:1의 경기가 대부분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팬들의 대부분의 관심 역시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팀'에 대한 팬덤의 관계는 예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토론 되어왔다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의 팀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안타까운 점은 '종족'팬덤의 소멸 혹은 약화입니다.
'종족'에 대한 팬덤은 스타리그가 3종족의 밸런스가 비교적 맞아떨어지는 덕분에 생겨난 자연발생적이며 자발적인 훌륭한 '팬덤'입니다.
그러나 프로리그는 이런 '종족'팬덤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숫자. 그리고 붕괴된 밸런스의 맵들. 수많은 신인들.
이런 프로리그의 시스템이 동족전을 양산시켰고 '개인'팬덤에 비해 비교적 구심적이 약한 '종족'팬덤은 흔들릴 여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종족의 잘모르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 신인들의 출현과 매니아들조차 다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경기'숫자는 더이상 한 종족의 팬이라고 말하기에 그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다 찾아볼수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팬덤은 스타라는 게임 특성상 절대 붕괴되지 않으며 팀리그체제에서 '팀'팬덤을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역활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족 팬덤은 프로리그 시스템이 고착화 될수록 점점 약해질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어제의 박성준 선수의 우승.
그러나 거기에 축하를 보내는 저그빠들의 숫자가 예전만큼 크지않다고 느끼는건 그냥 제 기우일뿐일까요?
'종족'팬덤이 약화된다고 스타리그의 입지가 줄어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고화된 프로리그시스템에서 '종족'에 의한 팬 유입보다는 '개인'의 경기에 대한 관심때문에 스타리그를 시청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그 그중의 몇몇이 그 선수가 속한 '팀'에 대한 팬이 되는게 협회가 바라는 프로리그의 시스템속의 팬의 체제일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리그 시스템은 '개인'의 스타성을 오래 지속시킬수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화려한 경기를 선보이던 선수조차 어느새 프로리그의 수많은 경기들속에서 소모되어버립니다.
그 짧은 기간속에서 그 선수의 팬이 한 '팀'의 팬이 된다면 다행인 스토리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 선수가 부진하면 그 선수를 응원하던 새로운 팬이 스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개인에서 또 다른 개인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 매니아들의 팬덤처럼 그 선수가 부진한 상태에서라도 '종족' 팬덤에서 오는 자발적인 관심의 지속은 더 이상 바라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저그와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자존심.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종족의 비애에 대한 볼멘 소리가 저에게도 그냥 '징징'거리는 한숨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저조차 프로리그의 시스템에 점점 적응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토스가 패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징징되는 거야."
"프로리그를 봐."
"저그를 때려잡는 수많은 프로토스가 있는데 한 선수가 졌다고 종족의 비애 운운하는건 한심한거 아냐"
라고 말이죠.
전 예전부터,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프로토스의 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때도 있고
지금은 여전히 한 선수-김택용-의 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스타리그 결승이 있었습니다.
프로토스 도재욱과 저그 박성준의 결승.
그리고 김택용 선수가 속한 SK T1이라는 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도재욱 선수를 응원했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박성준 선수가 3:2정도의 박빙의 승부로 이겨주길 바랬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만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도재욱 선수가 3:0으로 진 것에 대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로토스 선수가 진 것에 대한 종족적 비애에서 오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재미난 경기를 해주길 바란 것 뿐.
언젠가부터일껍니다. 정확하겐 모르겠어요.
몇가지 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프로토스 선수의 경기를 모두 감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토스 선수를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주 5 프로리그가 되면서 수많은 프로토스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전 여전히 대부분의 스타리그 경기를 보긴 하지만 가끔씩 보기 싫을꺼같은 예상이 드는 경기들을
스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기들의 기준은 예전같으면 프로토스가 나오지 않은
경기들이었지만 현재의 기준은 화제가 되지 않을 경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속한 팀 경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팀 경기는 가려가면서 봅니다.
이것이 협회에서 의도한 팀리그 체제의 경기감상법일껍니다.
네 제 취향도 협회의 의도대로 변한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확실합니다.
전 자발적인 종족 혹은 선수의 팬에서 강제적인 한 팀의 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팀이 잘하기에 기분은 좋습니다만 언제까지 응원하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둘째, 제가 싫어하는 테테전을 언젠가부터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테테전을 포함한 동족전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팬으로써 테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리그 초창기부터 왠만한 경기를 다 볼때도 가끔 보지않았던 경기들은 테테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테테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응원하는 선수의 팀의 테테전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으론 유명하고 잘하는 테란들의 테테전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몰랐던 테테전의 재미를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골라보는 습관을 더더욱 길러주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 프로리그 체제에서 가장 많은 것은 종족전이며 특히나 2008년의 프로리그 체제에서 테테전은 제 기억에서 다 열거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대부분의 경기들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볼때는 재밌었던 경기도 물론 있었지만 이것 역시 어떡해보면 스타리그에서의 "대안적 재미"를 찾으려는 매니아 팬의 발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겐 여전히 가장 기대되고 기억에 남을 경기들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의 개인전이며 타종족의 가장 잘하는
선수와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 프로리그의 체제에서 이런 경기가 일어날 확률은 순전히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재미'를 느낀 스타리그가 언젠가부터 '상대적'인 재미를 느끼는 유흥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주 5일 프로리그라는 시스템은 스타리그매니아들에게 '팀에 대한 팬덤'을 강화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팀에 대한 팬덤은 사실 다른 스포츠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야구나 축구같은 구기종목에서 팀에 대한 팬덤은 굉장히 파괴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스타는 구기종목이 아니며 1:1의 경기가 대부분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팬들의 대부분의 관심 역시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팀'에 대한 팬덤의 관계는 예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토론 되어왔다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의 팀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안타까운 점은 '종족'팬덤의 소멸 혹은 약화입니다.
'종족'에 대한 팬덤은 스타리그가 3종족의 밸런스가 비교적 맞아떨어지는 덕분에 생겨난 자연발생적이며 자발적인 훌륭한 '팬덤'입니다.
그러나 프로리그는 이런 '종족'팬덤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숫자. 그리고 붕괴된 밸런스의 맵들. 수많은 신인들.
이런 프로리그의 시스템이 동족전을 양산시켰고 '개인'팬덤에 비해 비교적 구심적이 약한 '종족'팬덤은 흔들릴 여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종족의 잘모르는 소위 말하는 '듣보잡' 신인들의 출현과 매니아들조차 다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경기'숫자는 더이상 한 종족의 팬이라고 말하기에 그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다 찾아볼수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팬덤은 스타라는 게임 특성상 절대 붕괴되지 않으며 팀리그체제에서 '팀'팬덤을 그나마 버티게 해주는 역활까지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족 팬덤은 프로리그 시스템이 고착화 될수록 점점 약해질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어제의 박성준 선수의 우승.
그러나 거기에 축하를 보내는 저그빠들의 숫자가 예전만큼 크지않다고 느끼는건 그냥 제 기우일뿐일까요?
'종족'팬덤이 약화된다고 스타리그의 입지가 줄어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고화된 프로리그시스템에서 '종족'에 의한 팬 유입보다는 '개인'의 경기에 대한 관심때문에 스타리그를 시청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그 그중의 몇몇이 그 선수가 속한 '팀'에 대한 팬이 되는게 협회가 바라는 프로리그의 시스템속의 팬의 체제일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리그 시스템은 '개인'의 스타성을 오래 지속시킬수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화려한 경기를 선보이던 선수조차 어느새 프로리그의 수많은 경기들속에서 소모되어버립니다.
그 짧은 기간속에서 그 선수의 팬이 한 '팀'의 팬이 된다면 다행인 스토리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 선수가 부진하면 그 선수를 응원하던 새로운 팬이 스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개인에서 또 다른 개인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 매니아들의 팬덤처럼 그 선수가 부진한 상태에서라도 '종족' 팬덤에서 오는 자발적인 관심의 지속은 더 이상 바라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저그와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자존심.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종족의 비애에 대한 볼멘 소리가 저에게도 그냥 '징징'거리는 한숨처럼 들리는 것은 어쩌면 저조차 프로리그의 시스템에 점점 적응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토스가 패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징징되는 거야."
"프로리그를 봐."
"저그를 때려잡는 수많은 프로토스가 있는데 한 선수가 졌다고 종족의 비애 운운하는건 한심한거 아냐"
라고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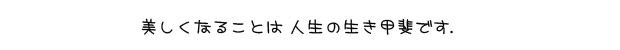
 rss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