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샤의 추억들에서 기대한 것은 딱 잘되면 "라스트 사무라이"정도의 영화는 되겠지라는 것입니다. 스필버그제작과 롭 먀샬 감독. 이 둘이 만났으니 그정도 기대감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 하자면 이 영화는 라스트 사무라이에 훨씬 못미치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전 어딘가 살짝 비뚤어져 있는지라 이 영화의 수많은 혹평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영화의 콘텍스트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노골적 평가들로 인해 이 영화를 살짝 옹호하고 싶단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영화 자체로 보면 그렇게 못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요. 제작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일단 영화의 때깔은 비할데 없이 이쁘고 연출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사실 지나치게 깔끔해 보여서 기술자적인 냄새가 너무 풍기기까지합니다만. 존 윌리엄스가 맡은 음악 역시 지나치게 깔끔합니다. 이 아저씨는 스필버그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더니 그 매너리즘까지 닮아가나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지적할만한 점은 영화의 이야기 자체 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역시 원작을 훼손 하거나 원작 이상을 보여주거나 그런게 아닌 딱 원작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점이 이 영화가 한국 혹은 아시아에서 실패할 수밖에없던 근본적 이유입니다. 원작 소설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원작자자체가 일본인이 아닌 이상미국적 관점에서 게이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이 영화는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지나친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불쾌한 영화입니다. 초반에 역동적인 캐릭터였던 장쯔이의 캐릭터는 어느새 "일본 최고의 게시야 메이커"라는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즉 이 영화는 게임을 통해 최고의 게이샤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이머의 감정 이상의 것을 관객들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즉 그 게임의 소재가 "게이샤"가 아닌 어떤 것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였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 영화의 가장 치명적 약점입니다. 즉 아시아의 민족적 특수성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에다 민감한 성적인 소재를 건드려 놓고도 뻔뻔하게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도 거세된 영화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장점에서 오는 드라마적 비극성은 우리네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런점도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즉 이 영화는 헐리웃의 오만한 기획력이 가져다주는 실착을 정면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인들에게는 신비스럽게 다가오는 쿵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진부한 이야기임을 헐리웃제작자들이 깨달았더라면 이런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껍니다만 소재고갈과 노감독들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판타지로 인해 이러한 아시아 영화들의 소재가 한동안은 더 지속해나갈꺼란 느낌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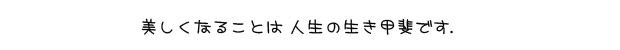
 rss
rss